“잃어버렸으면 말해야지. 그래야 존재하지“
1940년대, 일제강점기. 모든 것이 통제되고 억압되던 그 암흑 같은 시절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꺼지지 않으려 애쓰는 하나의 불빛이 무대 위에 반짝인다. 뮤지컬 <무명, 준희>는 글을 쓸 자유조차 빼앗긴 시대, 이름 없이 살아야 했던 청춘들이 서로를 통해 자신을 회복하고 존재를 증명해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링크드림아트센터 2관 무대 위, 조심스럽고도 강인하게 펼쳐지는 이 이야기는 부모를 잃고 어린 동생 연희를 지키기 위해 생업에 뛰어든 ‘준희’와, 조선어 시를 지키려는 젊은 시인 ‘정우’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현실에 짓눌려 더 이상 꿈을 꿀 수 없던 준희는, 자신이 감추고 있던 시적 감수성을 정우를 통해 다시금 떠올리게 된다. 반대로, 시로써 시대에 저항하던 정우는 준희와의 관계 속에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단단한 연대로 나아간다.
두 인물의 관계는 단순히 우정을 넘어서, ‘말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어떻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보여준다. 글을 쓸 자유를 잃고, 자신을 드러낼 권리를 빼앗긴 시대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단 하나의 청중이자 증인이 되어준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하루를 버텨야 했던 준희가 다시 글을 쓰기 시작하고, 정우는 그런 준희를 통해 시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게 되는 과정은, 억압을 뚫고 나오는 존재 선언 그 자체다.

준희 역의 강병훈 배우는 현실에 지친 청년이 점차 내면의 감수성을 회복해가는 여정을 절제된 연기 속에 담아내며 관객의 공감을 이끈다. 시인의 고뇌와 저항, 그리고 연대의 희망을 표현한 정우 역의 이석준 배우는 말맛 하나하나에 깊은 울림을 담아 인상적인 무대를 완성한다. 특히 두 배우가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장면은, 이 작품의 주제를 가장 강렬하게 전달하는 대목으로 손꼽힌다.
어린 동생 연희 역을 맡은 임하윤 배우는 짧지만 깊은 인상을 남긴다. 아이들에게 조선어 단어를 소리 내어 읽고 알려주는 장면은 단순한 교육이 아니라, 언어와 존재를 잃지 않으려는 저항이자 희망의 메시지로 다가온다. 그녀의 존재는 두 주인공의 이야기에 생명력을 더하며, 이 작품이 단지 어른들의 이야기만은 아님을 일깨운다.
무대 연출 또한 섬세하다. 조명은 시대의 무거움을 과장하지 않고 덤덤히 비추면서도, 희망과 절망이 교차하는 인물들의 내면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음악은 조용히 흐르면서도 장면마다 감정을 밀도 있게 채워주며, 노랫말은 마치 시처럼 관객의 마음을 두드린다. 특히 두 시인이 서로를 향해 손을 내미는 장면은, 말과 마음이 교차하는 진정한 ‘연대’의 순간으로, 잊히지 않는 여운을 남긴다.

뮤지컬 <무명, 준희>는 단지 시대극이나 청춘 드라마가 아니다. 그것은 말과 글, 시와 언어가 단지 표현의 수단이 아니라 ‘존재의 증거’였던 시대의 이야기이며,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를 묻는 강렬한 질문이다. 목소리를 빼앗긴 채 살아야 했던 이들의 고통은 멀고 낯선 이야기가 아닌,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에서 반복되는 현실의 메아리다.

“잃어버렸으면 말해야지.”라는 대사는 그저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문장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이다. 억압과 침묵 속에서도 말하고, 쓰고, 기록하고,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이 작품은 초연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완성도와 메시지의 힘으로 관객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뮤지컬 <무명, 준희>는 그 이름처럼 ‘무명’이지만, 그 속에 담긴 목소리는 결코 작지도, 약하지도 않다. 오히려 그 무명성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되며, 무대 밖으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퍼져나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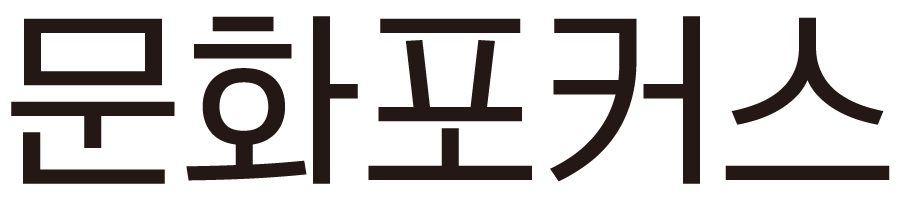



![[현장스케치] 이예서-조세현-문지원-손민채-전효은-최진아, 제80회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프리 스케이팅](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6/01/주니어-여자-포디움-360x180.jpg)
![[현장스케치] 이예서-조세현-문지원-손민채-전효은-최진아, 제80회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프리 스케이팅](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6/01/최진아-2-360x180.jpg)
![[현장스케치] 이루라-정희수-김수현-박규경-박나원-김가은, 제80회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프리 스케이팅](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6/01/김가은-360x180.jpg)



![[인터뷰] 은반 위의 예술가, 피겨 안무가 신예지가 그려내는 인생의 선율](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신예지2_4-360x180.jpg)
![[인터뷰] 빙판 위에 피어나는 꽃처럼, 피겨 허지유가 그리는 ‘감성적인 여정’](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허지유-7_1-360x180.jpg)
![[인터뷰] “세계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될 것”,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 배우 이호원](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20251127_나혼자만레벨업-온-아이스_-이호원-8-360x1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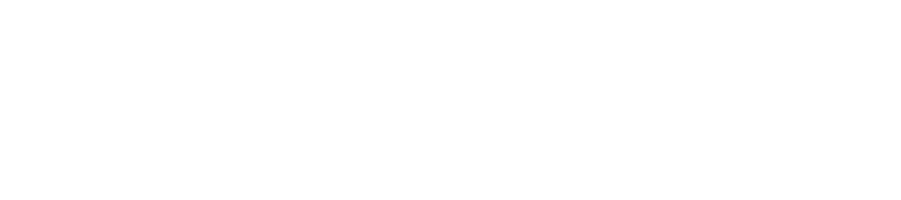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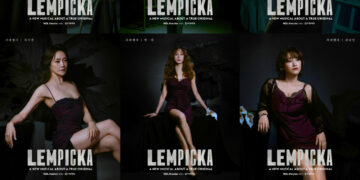
![[현장스케치] 김아진-루나, 인터뷰하는 말리](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marli234-360x180.jpg)
![[현장스케치] 김아진-루나, 인터뷰하는 말리](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marli287-360x180.jpg)
![[3월 4주차 공연소식] 이번 주 티켓팅 & 신작 소식 총정리](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07/3월-24일-30일-1-75x75.png)


![[인터뷰] 세계선수권 동반 은메달의 숨은 주역, 피겨스케이팅 퀸 · 킹메이커 지현정 코치](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3/06/359-120x86.jpg)
![[인터뷰] 빙판 위에 피어나는 꽃처럼, 피겨 허지유가 그리는 ‘감성적인 여정’](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허지유-7_1-120x86.jpg)
![[인터뷰] 피겨스케이터 유영, 그녀의 스케이팅이 말한 ‘진심’](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1/20251109_NHK-Trophy-유영-_인터뷰-1-120x8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