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민들레 피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의 삶을 다시 들여다보되, 잘 알려지지 않은 동생 윤일주의 서사를 함께 병치시키며 새로운 울림을 만들어낸다. 윤동주가 시대와 맞서 싸우며 남긴 시가 역사의 상징이 되었다면, 윤일주의 삶은 그 상징 뒤에 가려져 있었다. 공연은 이 두 형제의 평행적 서사를 무대 위에 나란히 세워, 관객으로 하여금 ‘윤동주만이 아닌 윤일주’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게 한다.

윤일주 ― 형의 그림자를 넘어 시를 꿈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동주는 알지만 윤일주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민들레 피리>는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든다. 어린 시절 민들레 피리를 함께 불며 자라난 형제는 같은 꿈을 꾸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윤동주는 민족의 아픔을 시로써 증언하는 길을 걸었고, 윤일주는 형의 빛에 가려져 ‘남겨진 자’로서 살아가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일주가 시를 꿈꾸게 된 이유는 단순한 동경이 아니었다. 그것은 형이 보여준 순수한 시심과 인간적 따뜻함에 뿌리박은 선택이자, 시대와 자신에게 남겨진 사명 같은 것이었다.
작품은 윤일주의 서사를 단순히 ‘동생의 그림자’로 소비하지 않는다. 오히려 윤일주가 형의 죽음을 넘어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기록하려 했던 시도를 정면으로 조명한다. 형을 기억하면서도, 그 기억에만 갇히지 않으려 했던 윤일주의 고뇌가 서정적 음악과 함께 깊이 전해진다.
윤동주와 윤일주의 평행적 서사
연출은 형제의 삶을 하나의 직선적 이야기로 엮지 않는다. 두 사람의 시간은 서로 교차하면서도, 때로는 나란히 흘러간다. 윤동주가 시를 통해 시대의 부조리에 맞서 싸울 때, 윤일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기록한다. 관객은 이들의 발자취가 서로 평행선을 그리듯 진행되면서도 결국 같은 질문으로 모여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시란 무엇인가. 삶을 기록하는 일, 인간을 위로하는 일은 어떻게 가능한가.’
윤동주의 시가 시대의 어둠을 향한 빛이었다면, 윤일주의 시는 남겨진 자들의 고통을 어루만지는 손길에 가까웠다. 작품은 이 두 가지 목소리를 병치하며, 시가 갖는 다층적 의미를 탐구한다.
실제 윤일주의 육성 낭독
공연의 클라이맥스는 무대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잔향을 남긴다. 마지막 순간, 관객은 배우의 목소리가 아닌 실제 윤일주의 육성 낭독 나레이션을 듣게 된다. 짧지만 강렬한 이 순간은, 공연이 단지 재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배우들이 만들어낸 극적 감정 위로, 실제 윤일주의 목소리가 덧입혀지며 무대와 현실의 경계는 허물어진다.
관객은 형의 죽음을 넘어 끝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했던 윤일주를, 더 이상 ‘동생’이 아닌 ‘시인’으로 기억하게 된다. 이 마지막 장치는 공연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를 응축한 듯한 울림을 준다.
뮤지컬 <민들레 피리>는 단순히 윤동주를 기리는 헌정극이 아니다. 그것은 윤동주라는 ‘이름’의 뒤편에 있던 윤일주라는 목소리를 다시 불러내는 작업이다. 형의 존재를 평생 짊어져야 했던 한 사람의 고통과 선택을 정면으로 다루며, 관객에게는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윤동주만을 기억할 것인가, 아니면 윤일주가 남기려 했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일 것인가.”
민들레 피리를 불며 함께 꿈꾸던 두 형제의 삶은 비극과 희망을 동시에 품고 있다. 공연은 화려한 장치 없이도, 시와 음악, 목소리만으로 그 울림을 관객에게 전한다. 무대를 나선 이들은 결국 윤동주의 시뿐 아니라, 윤일주의 목소리까지 마음에 품게 된다. 그것이 <민들레 피리>가 남긴 가장 큰 선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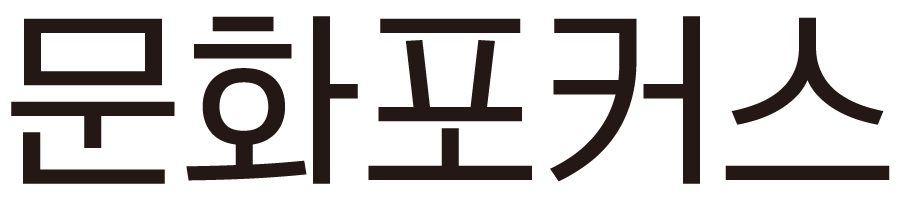



![[현장스케치] 이예서-조세현-문지원-손민채-전효은-최진아, 제80회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프리 스케이팅](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6/01/주니어-여자-포디움-360x180.jpg)
![[현장스케치] 이예서-조세현-문지원-손민채-전효은-최진아, 제80회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프리 스케이팅](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6/01/최진아-2-360x180.jpg)
![[현장스케치] 이루라-정희수-김수현-박규경-박나원-김가은, 제80회 피겨스케이팅 종합선수권대회 프리 스케이팅](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6/01/김가은-360x180.jpg)



![[인터뷰] 은반 위의 예술가, 피겨 안무가 신예지가 그려내는 인생의 선율](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신예지2_4-360x180.jpg)
![[인터뷰] 빙판 위에 피어나는 꽃처럼, 피겨 허지유가 그리는 ‘감성적인 여정’](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허지유-7_1-360x180.jpg)
![[인터뷰] “세계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될 것”,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 배우 이호원](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20251127_나혼자만레벨업-온-아이스_-이호원-8-360x1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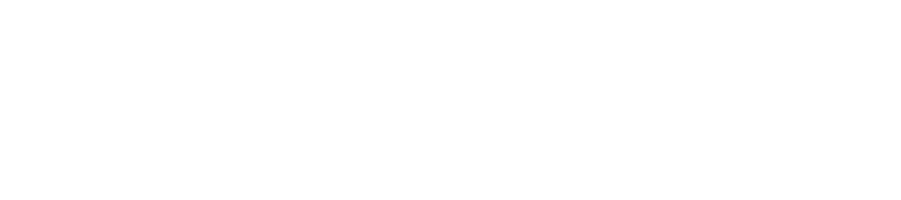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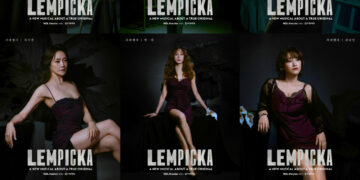
![[현장스케치] 김아진-루나, 인터뷰하는 말리](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marli234-360x180.jpg)
![[현장스케치] 김아진-루나, 인터뷰하는 말리](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marli287-360x180.jpg)
![[9월 1주차 공연소식] 이번 주 티켓팅 & 신작 소식 총정리](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08/9월-1일-7일-1-75x75.jpg)


![[인터뷰] 세계선수권 동반 은메달의 숨은 주역, 피겨스케이팅 퀸 · 킹메이커 지현정 코치](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3/06/359-120x86.jpg)
![[인터뷰] 빙판 위에 피어나는 꽃처럼, 피겨 허지유가 그리는 ‘감성적인 여정’](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허지유-7_1-120x86.jpg)
![[인터뷰] 피겨스케이터 유영, 그녀의 스케이팅이 말한 ‘진심’](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1/20251109_NHK-Trophy-유영-_인터뷰-1-120x8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