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이 스크린 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는 국내 창작 뮤지컬의 대표작을 영화관으로 옮긴 라이브 시네마 버전으로, 무대 위에서만 볼 수 있던 배우들의 열연과 세밀한 감정을 카메라를 통해 새롭게 조명한다.

이번 작품은 단순한 공연 실황이 아니다. 무대의 감동을 ‘영화적 언어’로 번역한 작품이다. 10대 이상의 카메라가 동원되어 장면마다 다양한 앵글을 교차하며, 객석에서는 결코 볼 수 없던 디테일을 담아낸다. 특히 빅터(규현)와 앙리(박은태)가 운명적으로 엮이는 넘버 <위대한 생명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 장면은 이번 버전의 백미다. 실험실 기계의 불빛이 배우의 눈빛과 교차하며 번쩍이고, 전류가 흐르는 순간 카메라가 클로즈업으로 이동해 빅터의 미세한 떨림까지 포착한다. 무대에서는 ‘과학의 광기’가 공간 전체로 확산되었다면, 스크린에서는 ‘인물의 내면’에 초점이 맞춰진다.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는 표정의 밀도감이다. 공연장에서라면 배우의 표정은 조명과 거리의 한계 속에 추상적으로 인식되지만, 영화에서는 미세한 시선의 흔들림과 숨결까지 생생하게 전달된다. 괴물로 변한 앙리가 빅터를 향해 “왜 나를 만들었느냐”고 절규하는 장면에서 박은태의 눈동자에 맺힌 눈물이 클로즈업되며, 인간의 절망과 분노가 스크린을 뚫고 나온다. 이 순간, 관객은 단순히 뮤지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인물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는’ 감각을 얻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무대의 현장감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번 라이브 버전은 뮤지컬 무대의 공간감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집중했다. 조명 전환, 세트 이동, 배우들의 동선까지 원작 공연의 흐름을 해치지 않고 담아냈다. 카메라가 무대를 종횡무진 오가면서도 관객의 시선을 교란시키지 않고, 오히려 ‘현장 속 한 자리에서 바라보는’ 듯한 시점을 만들어낸다. 이는 단순히 공연을 촬영한 것이 아니라, 현장과 스크린의 경계를 허무는 섬세한 연출의 결과다.
음악적으로도 영화관 환경은 새로운 매력을 드러낸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사운드가 극장의 서라운드 시스템과 결합하면서, ‘라이브’의 박진감이 배가된다. 특히 피날레 넘버 <나는 프랑켄슈타인>은 실제 공연보다 더 강렬하게 공간을 채운다. 관객은 숨을 죽이고 배우의 절규를 따라가게 되고, 마지막 순간 스크린이 어둠에 잠길 때까지 긴장감은 끊어지지 않는다.
<프랑켄슈타인: 더 뮤지컬 라이브>는 결국 무대를 스크린으로 옮기는 가장 정교한 형태의 실험이다. 공연 예술의 생동감과 영화의 집중력이 절묘하게 결합해, 관객에게 ‘다시 한 번 프랑켄슈타인을 새롭게 보는 경험’을 선사한다.
무대에서의 열정은 카메라를 통해 더욱 가까워지고, 배우의 숨결은 대형 스크린 위에서 더욱 또렷해졌다. <프랑켄슈타인>이 가진 광기와 인간성, 그리고 창조와 파멸의 서사가 이번엔 영화관 안에서 또 한 번 강렬하게 되살아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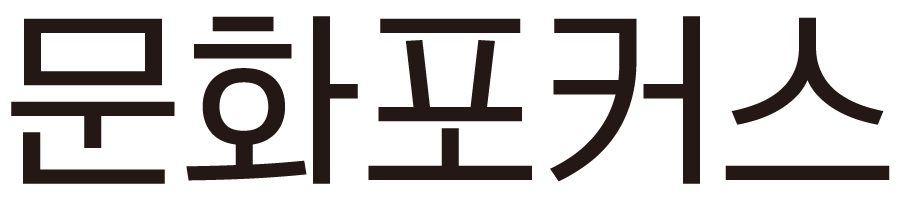
![[리뷰] 연극 ‘슈만’, 예술과 관계의 경계에 선 세 인물의 초상](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6/02/schumann03-360x180.jpg)
![[리뷰]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 다시 찾아온 뮤지컬 ‘긴긴밤’](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6/02/4ADAXWOYAZHHHIQDOQWQBUXTJI-360x180.jpg)







![[인터뷰] 은반 위의 예술가, 피겨 안무가 신예지가 그려내는 인생의 선율](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신예지2_4-360x180.jpg)
![[인터뷰] 빙판 위에 피어나는 꽃처럼, 피겨 허지유가 그리는 ‘감성적인 여정’](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허지유-7_1-360x180.jpg)
![[인터뷰] “세계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될 것”,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 배우 이호원](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20251127_나혼자만레벨업-온-아이스_-이호원-8-360x1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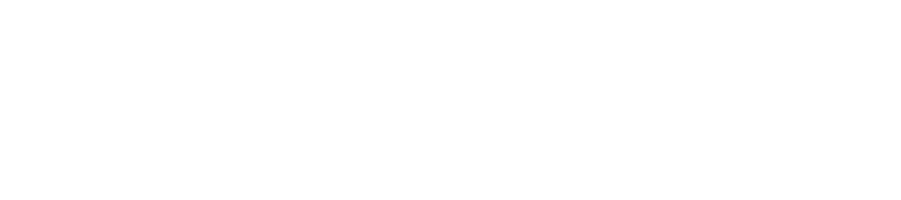


![[리뷰] 뮤지컬 <판> 이야기를 금지한 시대, 말하는 용기를 무대에 올리다](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6/01/8566_21409_4519-360x180.jpeg)


![[인터뷰] 세계선수권 동반 은메달의 숨은 주역, 피겨스케이팅 퀸 · 킹메이커 지현정 코치](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3/06/359-120x86.jpg)
![[인터뷰] 주니어 세계 1위 피겨스케이팅 신지아, 그녀가 성장하는 법](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3/11/신지아-선수-23-120x86.jpg)
![[인터뷰] 새로운 아침을 향해 달리다, 피겨스케이팅 윤아선](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3/07/503-120x86.jpg)
![[현장스케치] 차준환, 2026 ISU 피겨스케이팅 사대륙 선수권 갈라쇼](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6/01/차준환_사대륙_갈라3-120x86.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