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아르코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열린 제18회 K-Ballet World (서울국제발레축제) 「K-발레레퍼토리」 공연은 세 편의 작품을 통해 무용이 지닌 다양한 가능성과 감정의 스펙트럼을 선보였다. SHINHYUNJI B PROJECT의 〈비상〉, 서울발레시어터의 〈Fiesta_Wings of Life〉, 박기현 발레단의 〈그해 6월, 이름 없는 별이 되어〉가 차례로 무대에 올랐으며, 각 작품은 예술적 메시지와 정서를 관객에게 생생히 전달했다.
침묵을 소재로 그려낸 인간의 내면 — 〈비상〉

〈비상〉은 시작부터 특별했다. 무대의 첫 장면에서 관객이 마주한 것은 화려한 군무도, 현란한 음악도 아니었다. 그저 정적(靜寂), 침묵이었다. 공연을 시작하기 전 무용수들이 느끼는 설렘과 긴장, 기대와 두려움 같은 복합적인 감정을 말이 아닌 침묵의 순간으로 표현하며, 작품은 관객을 무대의 ‘내면’으로 초대했다.
곧 발레의 선율적인 움직임과 탭댄스의 경쾌한 리듬이 교차하며, 침묵 속에 잠재된 소리가 몸짓으로 피어올랐다. 무용수들의 발끝에서 울려 나오는 리듬은 단순한 박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심장 박동처럼 관객의 감각을 흔들었다. 여기에 현대무용과 아크로바틱이 결합되면서 무대는 끊임없이 변주되었고, 정적에서 동적으로 이어지는 “소리와 움직임의 서사”가 완성됐다.
특히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를 거쳐간 역대 빌리들이 한 무대에 다시 모였다는 점은 작품의 의미를 더욱 깊게 했다. 어린 시절 춤으로 세상과 맞섰던 소년들이 이제는 성숙한 예술가로 성장해 다시 같은 무대에 섰다는 사실은, 개인의 성장사와 예술적 여정이 맞물리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관객은 무대를 바라보며 단순히 한 편의 공연을 본 것이 아니라, 시간이 만들어낸 예술적 증명을 함께 목격한 셈이다.
자유와 생명의 축제 — 〈Fiesta_Wings of Life〉

서울발레시어터의 〈Fiesta_Wings of Life〉는 제목처럼 자유롭고 활기찬 생명의 축제였다. 작품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삶의 찬란함”을 발레의 몸짓으로 구현했다. 무용수들의 팔과 다리가 날개처럼 뻗어나가는 장면은 보는 이에게 자연스러운 해방감을 주었고, 역동적인 군무는 관객 스스로도 몸을 흔들고 싶게 할 만큼 강한 에너지를 발산했다.
특히 생상스의 「죽음의 무도」가 울려 퍼질 때, 무대는 단순한 축제를 넘어 삶과 죽음이라는 보편적 주제로 확장됐다. 어둠 속에서 죽음은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춤은 그 죽음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무용수들의 움직임은 마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말하는 듯했다.
관객은 공연을 통해 일상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고, 삶의 순간이 가진 생명력을 새삼 깨닫게 된다. 무대 위의 움직임은 단순한 발레가 아니라, 인간의 존재 그 자체를 찬미하는 행위였다.
별빛으로 남은 소년들을 기억하다 — 〈그해 6월, 이름 없는 별이 되어〉

박기현 발레단의 작품은 역사의 무게를 무대 위에 불러냈다. 1950년 6월 한국전쟁 발발의 순간, 모자를 눌러쓴 채 전장에 나선 소년들이 무대에 등장한다. 그들의 걸음은 두려움과 이별을 안고 있었지만, 동시에 지켜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소년들은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채 쓰러져 별이 되었으나, 작품은 그 별빛을 다시 소환한다. 군무에서는 수많은 소년들의 집단적인 두려움과 희생이 표현되었고, 솔로 무대에서는 개인이 느끼는 고독과 비극이 섬세하게 담겼다. 마지막에 무용수들이 흩어져 사라지고, 그 자리에 별빛 같은 조명이 퍼져 나가는 장면은 관객의 가슴에 오래 남는 장면이었다.
〈그해 6월, 이름 없는 별이 되어〉는 단순히 전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묻는다. 무대는 과거의 소년들을 다시 불러내며, 그들의 희생 위에서 이어지고 있는 오늘의 평화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졌다.
세 무대가 남긴 깊은 울림
〈비상 ENVOL〉은 침묵을 소재로 인간 내면의 여정을 그렸고, 〈Fiesta_Wings of Life〉는 생명의 찬란한 순간을 축제처럼 펼쳐냈으며, 〈그해 6월, 이름 없는 별이 되어〉는 별빛이 된 소년들을 불러내 기억과 평화를 환기시켰다.
세 작품은 서로 다른 결을 지녔지만, 관객에게 남긴 인상은 공통적이다. 무용은 단순한 움직임의 나열이 아니라, 삶을 비추는 언어이자 기억을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것.
공연이 끝난 후에도 관객의 마음속에 긴 울림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언어가 몸을 통해, 움직임을 통해 생생하게 전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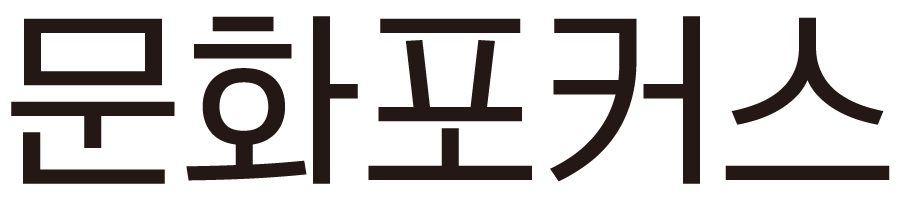









![[인터뷰] 은반 위의 예술가, 피겨 안무가 신예지가 그려내는 인생의 선율](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신예지2_4-360x180.jpg)
![[인터뷰] 빙판 위에 피어나는 꽃처럼, 피겨 허지유가 그리는 ‘감성적인 여정’](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허지유-7_1-360x180.jpg)
![[인터뷰] “세계 어디에도 없던 새로운 형태의 공연이 될 것”, ‘나 혼자만 레벨업 on ICE’ 배우 이호원](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12/20251127_나혼자만레벨업-온-아이스_-이호원-8-360x18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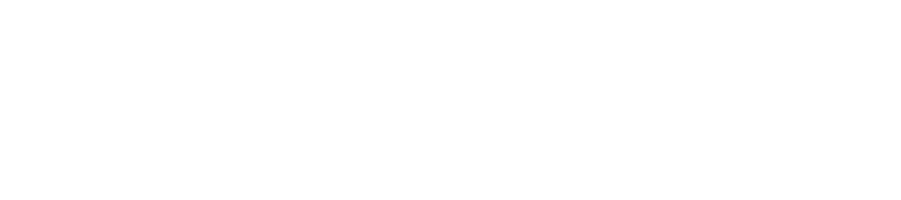







![[인터뷰] 임해나-권예, 아이스댄스 국가대표가 전하는 ‘함께’라는 초심](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5/07/177A1910-120x86.jpg)


![[인터뷰] 주니어 세계 1위 피겨스케이팅 신지아, 그녀가 성장하는 법](https://mfocus.kr/wp-content/uploads/2023/11/신지아-선수-23-120x86.jpg)